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될 때뿐이었다. “민의(民意)의 승리”라며 유권자를 추켜세우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대체로는 의례적인 공치사로 끝나기 마련이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이긴 선거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주민들은 늘 들러리였고, 패배자였다. 그렇다고 꼭 지방선거에서만의 얘기도 아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자포자기의 무관심만 늘어가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 차량의 확성기에서는 지지를 호소하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을 앞세워 온갖 공약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들떠보는 사람은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 정도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후보 명함을 나눠주는 운동원 대부분도 어차피 10만원 안팎의 일당 때문에 나선 사람들일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정당별 지지율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전화가 오면 짜증을 내면서 끊어버리는 여론조사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출마자들의 득표율을 모두 합쳐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기껏 20%의 득표율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선거에 무려 1조 770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를 꾸짖을 수는 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투표가 가장 직접적인 권리 행사다. 하지만 그동안 가슴에 상처를 입은 유권자들에게 이번만큼은 제대로 투표해서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설득할 자신은 없다. 당선자들이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해 유권자들 스스로 영악해진 것이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 것인지 기대해도 될 것인가. <논설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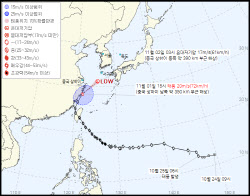




![[포토] 송민혁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474t.jpg)
![[포토] 화사, 매력적인 자신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93t.jpg)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