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규제완화를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전략이다. 중소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가 그 사례이다. 물론 대부분은 특구가 아니면 시도하기 어려운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굳이 특구제도가 아니어도 추진가능한 규제완화도 없진 않다. 최근 전기자전거 모터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허용한 것이 그 예이다.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출력의 350W 제한은 오르막이 많은 한국지형에 부적합한 규제였다. 문제는 규제완화 절차가 너무 길었다는 점이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전기자전거 업체는 2019년부터 참여해 약 3년만에 결론을 얻었다. 전남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기간을 빼고도 말이다. 그런데 500W급 전기자전거는 2013년부터 수입돼 2015년에는 백화점에도 들어 왔다. 500W 전기자전거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가 꼭 필요했을까? 정부가 해외사례와 여론을 참고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을까.
둘째, 규제샌드박스로 시험기간을 두는 전략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 기반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고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이 심화되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요응답형 이동수단(DRT)을 서울에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DRT는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탑승해 각각 목적지에 하차하는 서비스다. DRT는 중소형 버스로서 안정성을 테스트해야 할 신기술 운송수단도 아닌데 샌드박스를 거치며 시험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냥 허용하면 될 규제를 샌드박스로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넷째, 일부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도 적절치 않다.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해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 신속처리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규제완화가 일부 소부장 기업에게만 우대되는 것은 산업부의 영향력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규제완화의 효과를 제약하는 일이다.
규제 특례제도, 샌드박스, 한시규제완화 등은 규제완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 주어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규제완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규제개혁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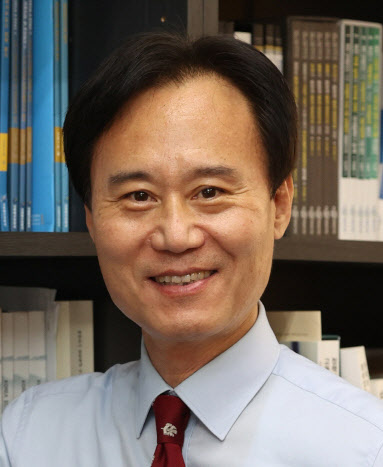






![[포토] 맘스홀릭베이비페어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108t.jpg)
![[포토]수도권 첫 한파주의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027t.jpg)
![[포토]'무죄'받고 이동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98t.jpg)
![[포토]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87t.jpg)
![[포토]전국정당을 넘어 K-정당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48t.jpg)
![[포토]발언하는 권영세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599t.jpg)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내일 체감온도 영하 17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820t.jpg)

![[포토] 김혜수, 나홀로 화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074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